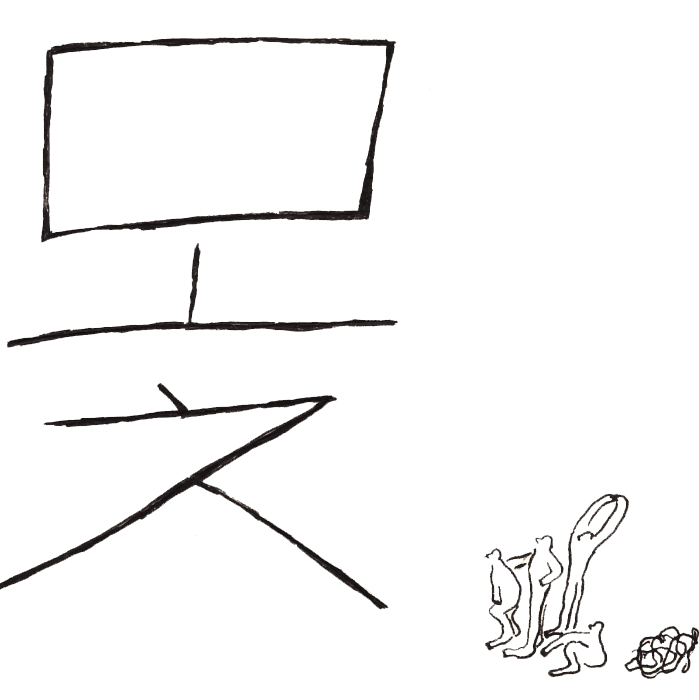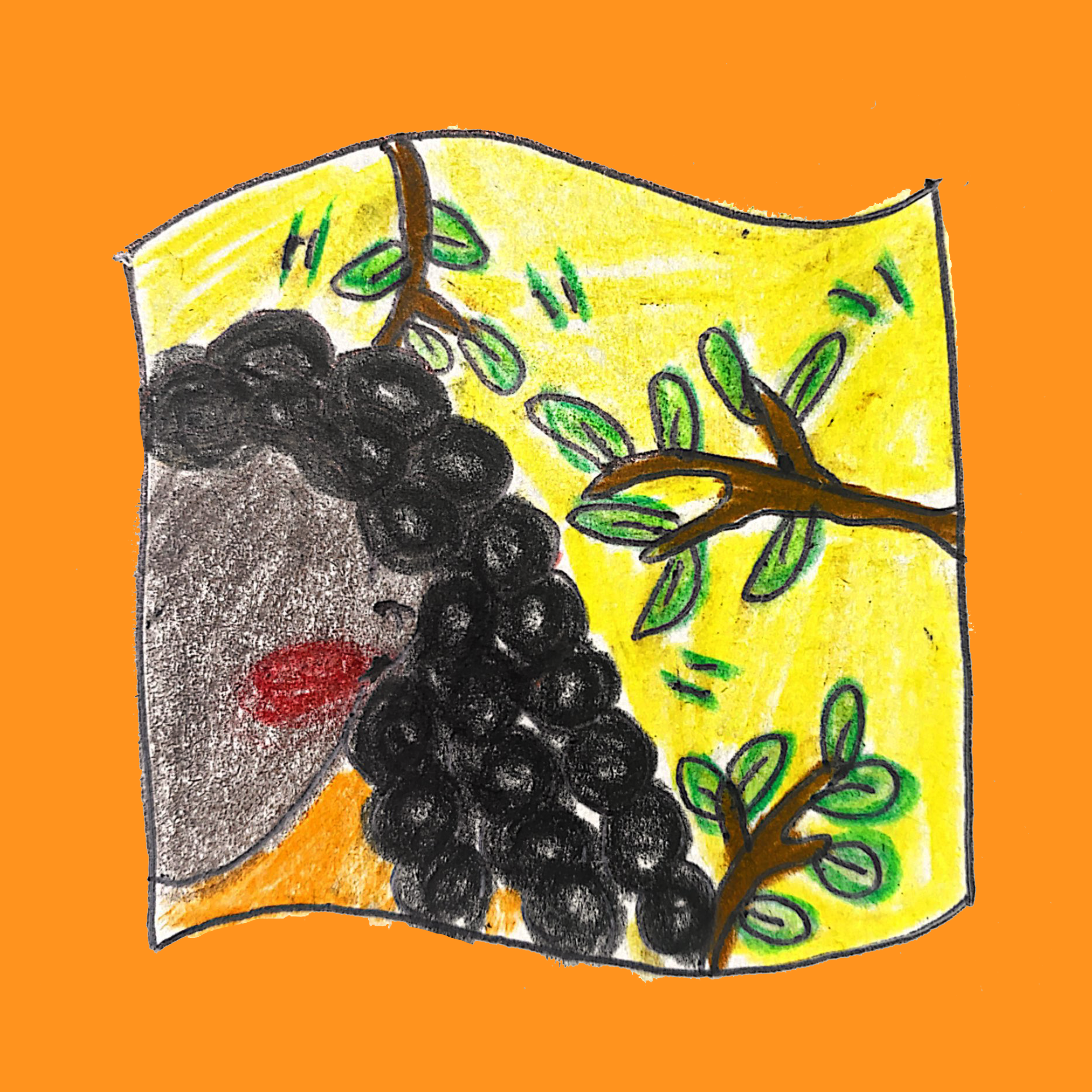32화. 우우 풍문으로 들었소- 춤추며 그러모은 문장들
흙냄새가 난다고 했고, 종종 모래바람이 분다고도 했다. 무엇보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흙 위에서 맨발바닥으로 춤추는 이들이 많다고 했다.
춤의 세계를 사랑하게 된 이들에게는 각자의 첫 춤이 있다. 나의 첫 춤은 서아프리카의 만딩고 문화를 바탕으로 한 만딩고 춤이다. 물론 나의 뼛속 깊은 곳에는 어른들의 박수와 함박웃음을 받으며 신나게 흔들어 재꼈던 어린 시절의 개다리 춤이 있고, 한때를 풍미했던 가위춤과 망치춤, 누군가 항~상 내 곁에만 있어 주길 바라며 좌우로 두 주먹을 둥글게 둥글게 흔들던 춤과, 몸에 흐르는 신명을 얼~쑤 외치며 어깨 위로 들썩이던 손놀림이 있다. 만딩고 춤을 만나기 훨씬 이전부터 각인된 것들이지만 춤을 더욱 궁금하게 만들고, 잘 추고 싶다는 욕망을 부추기고, 세계관을 넓히며 사유를 더욱 멀리 이끈 생의 첫 춤을 꼽아보라면 역시, 만딩고춤이다.
춤을 안내하던 안무가와 연주자, 함께 춤추던 친구 중 몇몇은 겨울이 찾아오면 종종 아프리카 대륙으로 떠난다. 부르키나파소, 세네갈, 베냉, 기니, 코트디부아르. 내 생에 접점이라곤 티끌만큼도 없었을 것 같은 나라의 이름을 이제는 줄줄이 왼다. 언젠가 꼭 한 번쯤은 가보고 싶은 곳 목록에 올려두고선. 목록은 매년 친구들이 넓히고 들려주는 이야기만큼 갱신된다. 댄서나 연주자로 활동하고 있거나, 춤을 통해 발견한 내면이 깊어졌거나, 자신만의 리듬과 움직임을 찾고자 하는 이들, 즉 내 주변의 근사하고 용기 있는 이들은 벌써 다 한 번은 다녀왔다. 그들은 한국으로 돌아와 그곳의 춤판은 어떠했는지 생동감 넘치는 표정을 곁들여 설명하며 자신만의 춤 세계를 넓혀갔다.
아이들은 리듬을 따라 공중으로 몸을 부웅 치켜 방방 뛴다고 했다. 자주 크게 웃으면서. 제법 덩치가 있는 할머니도 빠른 리듬에 몸을 싣고, 때때로 리듬과 밀당을 한다고 했다. 아크로바틱이 화려한 움직임도 있고, 탈춤처럼 온몸에 털을 감싸 입고 추는 춤도 있다고 했다. 마을에 깃든 서사를 마치 우리네 당산나무처럼 긴 세월 품고 지킨 커다란 나무가 있고, 누군가는 하마를 만난 적도 있다고 했다. 바다와 대륙을 넘어 도착한 그곳에서 누구든 한 번은 아프기 마련이라고도 덧붙였다. 갑작스레 달라진 기후와 풍토, 음식과 물때문일 수도 있고 조급함이나 낯선 문화에 대한 경계로 몸이 마음을 따라가지 못해 생기는 일일 수도 있다고 했다.
지난 6년간 풍문으로 주워들은 것들이다. 정말 그런지 아닌지 알 수 없겠지. 아마 잘못된 정보도 있을 테고, 오해에서 비롯된 주관적 해석도 담겨 있을 것이다. 우리가 한 세계에 풍덩 뛰어든다고 해서 단숨에 모든 것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것처럼. 내 눈으로 목격하고 이 몸으로 어울렁더울렁 해보기 전까진 알 수 없겠지.
그치만 너무 긴 시간 주워들었기 때문일까. 아니면 그들이 들려주는 이야기에 심하게 몰입해서였을까. 이제는 사진과 영상으로 경험과 기록을 엿볼 수 있는 시대인지라, 가끔은 마치 내가 겪어본 일처럼 생생하다. 만딩고 춤을 추는 동안 오랫동안 떠올려온 풍경이기에 상상은 주체할 수 없을 만큼 멀리 뻗어가고, 나는 찬 바람이 불고 함박눈이 내리는 겨울의 도시에서 주홍빛의 모래바람과 쨍한 볕을 문득문득 떠올리는 사람이 되었다.
만딩고 춤을 배우기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았을 무렵, 함께 춤추던 이들 중 몇몇이 와르르 부르키나파소에서 겨울을 맞이할 거라는 소식이 들었다. 당시 나는 춤이 너무 재미있고 흥미롭지만 춤과 한평생 동떨어진 삶을 살아왔기에 함부로 엄두내서는 안 되는 일이 아닐까, 하고 아쉬움을 넘겼다. 해를 거듭할수록 겨울마다 춤추러 부르키나파소를 비롯한 아프리카의 여러 나라를 방문하는 이들이 늘어 간다. 누군가는 그곳에서 춤추다가 사랑을 만나고 지구를 찾아온 새 생명을 맞이하기도 했다. 아시아와 아프리카라는 두 대륙을 오가며 삶과 사랑과 관계와 춤의 자리를 넓히는 이들이 생겨난다. 춤에 대한 마음이 진지해질수록 한편으로는 부르키나파소의 춤판을 만나는 타이밍을 유보하고 싶은 욕구도 들썩인다. 나는 아직 준비가 덜 된 것이 아닐까? 정말 모두에게 내 안의 기쁨과 슬픔을 공유하며 춤출 수 있을까? 정말? 내가?
그곳에선 잔치가 열리면 누구든 춤을 춘다고 했다. 축하할 일이 생기면 춤을 추고, 생의 짝꿍을 맞이하면 춤을 추고, 심지어 죽음을 기리는 자리에서도 춤은 빠지지 않는다고 했다. 부르키나파소에서 온 어느 연주자는 한국살이 N년차에 이런 평을 남겼다.
‘한국의 결혼식은 부르키나파소의 장례식보다도 재미가 없어….’
흑. 인정하는 바이다. 춤판이 흥 넘치게 열리는 결혼식을 본 건 정말 손에 꼽는다(대부분 형식적인 의례와 축가 혹은 연주로 채워지곤 하니까).
쿨레칸의 동료와 친구들은 이번 겨울, 팬데믹 이후 처음으로 부르키나파소에 간다. 한국에 거주하며 아프리카 문화권의 춤과 리듬을 알리고 소개하던 이들 역시 이번 겨울에는 죄다 아프리카의 어딘가로 떠날 거라 했다. 만딩고 춤이 없는 겨울은 몹시 쓸쓸하고 외롭고 잔혹하고 무자비할 것만 같다. 누구랑 어디에서 춤을 춰야 할까? 뒤늦게 일상을 단단하게 만들어 준 소중한 것이 무엇이었는지 모래바람처럼 훅 몰려온다.